마을과 함께하는 이웃 이우림 시인∙수필가

장애인들에게 치유글쓰기 지도
동아리 길거리 시화전도 열어
“마음속 응어리진 말들 풀어내며
스스로 마음 다독이는 글쓰기”
[고양신문] 얼마 전 뜻깊은 시화전이 열려 시민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 장애인 글쓰기 동아리 ‘물소리’가 제1회 길거리시화전 ‘동글동글 굴러가는 詩(시)랑 가을맞이’를 10월말부터 주엽동 문화공원과 백석동 흰돌마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었다. 시화를 접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전해주는 진솔한 마음의 글에서 감동을 받고, ‘장애’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 이우림 시인을 만났다.
이론보다는 마음을 여는 글쓰기
“10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받았던 분들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수업도 못하니 다들 너무 답답해서 전시회를 기획해 저질러 버렸지요.”
이우림 시인은 2010년부터 탄현동 소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글쓰기’ 강좌의 강사로 시와 수필을 지도해 왔다. 10여 명의 참가자는 대부분 중도장애인들이다. 경추손상으로 목 아래로는 마비되어 손만 겨우 움직이는 수강생도 있다. 글쓰기 수업이지만 ‘말로 쓰기’도 한다. 쓰고 싶은 이야기들은 말로 하고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쓴다.
“글쓰기를 지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장벽이 느껴졌어요. 사고로 중증장애를 입고 하루아침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했으니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상처와 분노, 원망이 글에서 느껴졌어요.”

이들에게 시 작법 이론이 무슨 소용이랴. 이 시인은 직유법, 은유법 이론 공부는 접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마음의 벽을 깨는 글쓰기 수업으로 바꾸었다. 분노면 분노, 슬픔이면 슬픔이 터져나오는 대로 글에 담도록 했다. 회원들이 서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고 들어주며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벽을 허무는 데 3~4년이 걸렸다.
“제 글쓰기 수업은 치유를 목적으로 해요. 글쓰기는 마음을 여는 과정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비법이지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는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것, 모두 친구라는 것을 알리고, 일반인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고 한다.
이 시인의 치유글쓰기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이어진다.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는 또 다른 상처와 고민을 안고 있다. “때로는 아주 거친 말을 써내려가기도 해요.”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일 것이다. 마음속 응어리진 말들을 써내려가며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한다.
“글로 치유되어 취업을 했다는 소식에 흐뭇하고 글쓰기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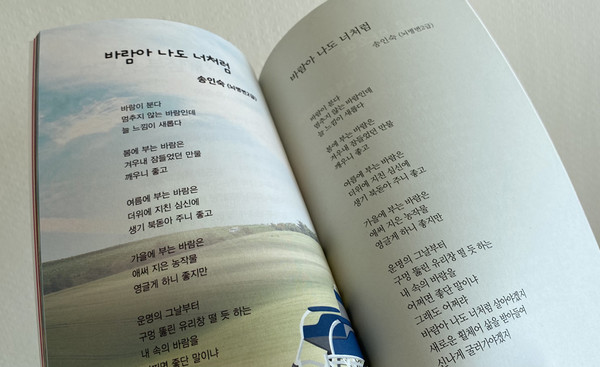
시인에게도 치유의 과정이었던 글쓰기
시인은 신체와 정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글쓰기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인 본인에게도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학창시절에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주관하고 글을 잘 쓴다는 평을 듣던 그는 대학 진학 무렵 ‘글쓰기는 이만큼 쓰면 됐지’하는 생각에 간호학과로 진학했다.
“교만했지요. 자기가 정말 잘 쓰는 줄 알았던 거죠.”
대학 진학 후 글쓰기와는 담을 쌓고 지내다 동네 친구 오빠와 결혼해 시댁에 들어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시작했다. 남편은 통신선로 관련 업무로 지방에서 주로 지내고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올 뿐이었다. 시할머니, 시부모, 형까지 대가족 살림이었다. 시어머니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살림을 전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어머니가 가게 가서 두부 사와라, 시키기 전에는 문밖 출입도 잘 하지 않으며 살림을 했어요. 어머님이 뭐 드시고 싶다고 하면 그거 준비해서 드리고 매일 이불 홑청 빨아서 풀 먹여 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 아내의 고충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시인을 감싼 건 외로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첫아이를 출산하다 마취제 쇼크로 “죽었다 살아나면서” 평생 고쳐지지 않는 두통이 시작됐다.
“내가 나를 놓거나, 챙기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했던 상황"에서 버스 안에서 우연히 펼쳐든 생활정보지의 ‘문학회 회원모집’ 광고가 가슴 속으로 훅 들어왔다. 그 다음날로 문학회에 가입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글쓰기와 조우한 것이 1992년. 3년간 열심히 글을 쓰고 다듬어 1995년 ‘시와 시인’에 시로 등단, 2012년 ‘문학과 의식’에 수필로 등단했다. 1998년부터 고양시문인협회(문협)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문협 회장을 맡았다.

글쓰기는 곰삭은 멸치액젓처럼
시인 자신에게 글쓰기는 어떨까? “글쓰기는 운전을 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한 달 정도는 마음에 품고 되뇌며 언어를 다듬어 글로 적어요. 저는 글을 ‘마음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바다에서 잡은 멸치가 곰삭은 멸치액젓이 되는 것같은 과정으로 나의 글은 태어나지요. 오래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쓰는 글이라 한번 쓰고 나면 수정은 거의 없어요.”
이우림 시인은 다섯 살 때부터 살아온 창릉천의 생태와 환경을 동시와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 꿈이 있다. 올해 펴낸 시집 『당신에게 가는 길을 익히고 있다』가 2020아르코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