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책모임 중독자의 고백
『나의 한국 현대사』(유시민. 돌베개)

[고양신문]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이다. 젊은 층 관람객들은 심박수 인증으로 너도나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내 경우엔 심박수를 체크할 필요도 없었다. 영화를 보기 전,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간단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또 한 번의 군사 반란으로 집권의 야욕을 내비친 전두환과 그 일당이 벌인 성공한 쿠데타.
영화를 본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서울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전두환이 1공수, 5공수, 3공수를 끌어들일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은 단 하나였다. ‘우리 아버지는 몇 공수였을까?’

30년 군 생활 동안 아버지가 입에 올린 내용들은 대부분 무용담이었다. 수시로 비상이 걸려서 총을 차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아 왔던 나였다. 시골의 좁은 하사관 아파트에 사는 삶이 신물 났기에 군인 아버지가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았다. 누리는 것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훨씬 많았던 유년시절이었다.
근대사를 조금 알게 된 이후에는 공수부대였던 아버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가끔은 꺼려졌다. 간부 출신이 아니었던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퇴직한 간부 사업자금에 보증을 섰다가 몇천만원을 날렸던 아버지였기에 군인의 유대감도 얄팍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평소 부대 내 있었던 소소한 사건, 훈련 에피소드, 장교 뒷담화 등은 얘기해도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현대사와 얽힌 것에는 입을 다물었다. 폐쇄된 군생활에 매몰되어서일 수도 있고, 경상도 출신의 보수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다. 누군가를 열렬하게 칭찬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격렬하게 비난하지도 않았다. 종편 채널이 생긴 이후로 그 뉴스만 시청하는 것으로 보아, 감히 아버지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뿐이다.
난 아버지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했다. 30년 하사관 근속만이 목표인, 평범한 군인이자 시민이라고 여겼다. 십수 년 전,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때 우리도 광주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비상인데도 뭐 어쩌다 보니 차출이 안 되었지.”
왜 차출이 안 되었는지도 말한 것 같은데, 어른들 대화를 귀동냥한 거라 흘려들었다. 다만 그때, 내가 세 살 때, 아버지가 광주에 가지 않았던 게 우리 가족의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그 끔찍한 현대사의 한가운데에 내 부모가 서 있지 않았음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런데 12·12 군사반란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던 걸 영화로 직면하니, 다시 공포감이 밀려왔다. 1979년 우리 가족은 포천에 있었다. 서울로 진입한 반란군 쪽 공수여단에 아버지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후반부 60여 분의 시간 동안 난 분노보다 공포감에 눈물이 났다. 이념도 뭣도 아닌, 오로지 반란군의 명령 때문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현장에 제발 내 가족이 있지 않기를 바랐다.
영화 관람이 끝난 뒤 인터넷 검색을 한 뒤에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여단은 12월 12일에 출동하지 않았고, 1982년 내륙으로 여단이 이전했다. 그 덕분에 난 시골에서 유년시절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도심의 즐거움은 없었지만, 굵직한 현대사의 위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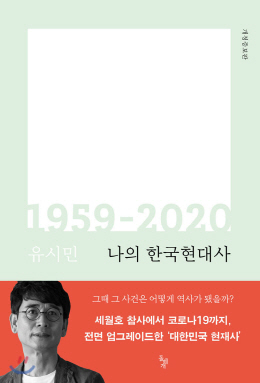
공교롭게도 영화 관람 직전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를 읽었다. 작가 개인사와 엮은 한국 현대사이기에 얼마나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역사의 현장에 존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진보논객이라고 평가되지만, 자기 감정을 누르고 진보와 보수를 편 가르지 않는 시각이 돋보였다.
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대사의 흐름을 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친일은 객관적으로 나쁘지만, 보수와 진보는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선거와 투표로 이루어진 지금의 대한민국이 싫을 순 없지만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